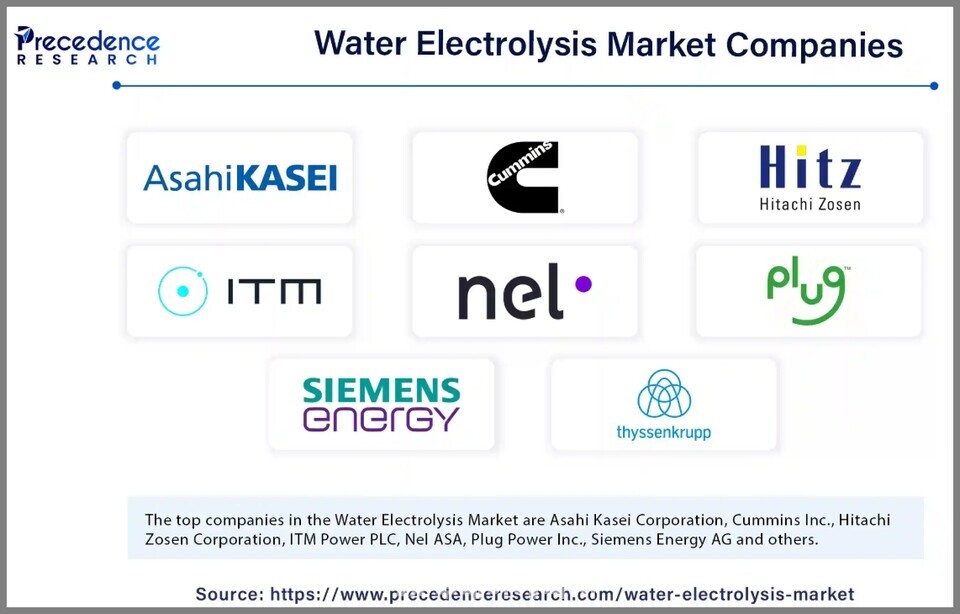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물 전기분해(water electrolysis) 시장이 2025년 72억 5000만 달러에서 2034년 144억 달러까지 연평균 7.9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2024년 기준 28억9000만 달러에서 2034년까지 62억6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 시장의 43%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 그린수소 수요가 성장 견인…AI 접목도 ‘생산 효율’ 게임체인저
산업계와 정부가 탈탄소화를 가속화함에 따라, 수소 생산 방식도 화석연료 기반에서 물 전기분해 기반의 그린수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수송, 화학, 발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제로 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전해 설비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수전해 시스템의 실시간 운영 변수(전류 밀도, 온도, 전해질 농도 등)를 정밀 제어하고, 예측 유지보수(Predictive Maintenance) 기능까지 제공함으로써 생산 최적화 및 장비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전력 손실을 줄이고 수소 생산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아시아, 수전해 시장의 ‘중심축’…中 수소로드맵이 시장 견인
2024년 기준, 중국, 일본, 한국, 호주가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수소산업발전계획(2021~2035)'에 따라 철강·시멘트·화학 등 산업에서 수소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내몽골·간쑤성에 그린수소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 경제산업성(METI) 주도로 1억 1,300만 달러 규모의 PEM 전해조 보급 패키지를 출범했다. 한국은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술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 및 인프라법(2021)에 따라 청정수소 허브 구축과 수전해 설비 도입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유럽은 REPowerEU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000만 톤의 재생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품별·용도별 성장 트렌드…PEM 기술 급부상, 발전소용 수요도 확대
제품 유형별로는 알칼라인 수전해(Alkaline Water Electrolysis, AWE)가 2024년 시장의 59%를 점유하며, 저비용·검증된 기술로 산업용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PEM(Proton Exchange Membrane)은 빠른 반응속도, 고효율, 가변 부하 대응 가능성 덕분에 재생에너지 연계형 프로젝트에 적합하며, 가장 빠른 성장률 기록중이다.
용도별로는 화학 산업(43% 점유)이 암모니아·정유·메탄올 공정에 수소 수요가 집중되며 전환 수단으로 수전해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 발전 부문은 연료전지 및 가스터빈 기반의 무탄소 전력원으로 수소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확산되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시평] 새 정부, 대한민국 수소산업 ‘퀀텀 점프’ 이끌어야
- 일본, ‘화이트수소’ 탐사 시동…JOGMEC 전국 생성지역 조사 개시
- 호주, 천연수소 탐사 본격화…Edmund-Collier서 '열기원 수소' 잠재성 확인
- 이탈리아, 수소-가스 혼합 연료 산업 실증 개시…사르데냐에서 첫 공급
- EU, 수소기술 26대 프로젝트에 1.5억 유로 투입
- 태양광 넘어 수소도 장악…중국, 그린수소 특허 1위로 부상
- "PEM vs 알칼라인…그린수소 생산 기술 경쟁 본격화"
- 2035년까지 80배 성장하는 그린수소 시장…'알칼라인'·'PEM' 전해조 기술이 견인
- 서호주, 유럽에 그린수소 공급 거점 가능성↑
- 환경부, 생성형 AI 체험단 본격 가동…환경 행정 디지털 전환 시동
- 히타치 에너지, 중국 송원 그린수소 프로젝트에 전력 솔루션 공급
- 헤이저그룹, 일본 나고야 청정수소 생산 본격화… 연 2500톤 규모 시설 추진
- 2042년 무탄소전력 21.4TWh 부족...“PPA 제도, 이젠 선택 아닌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