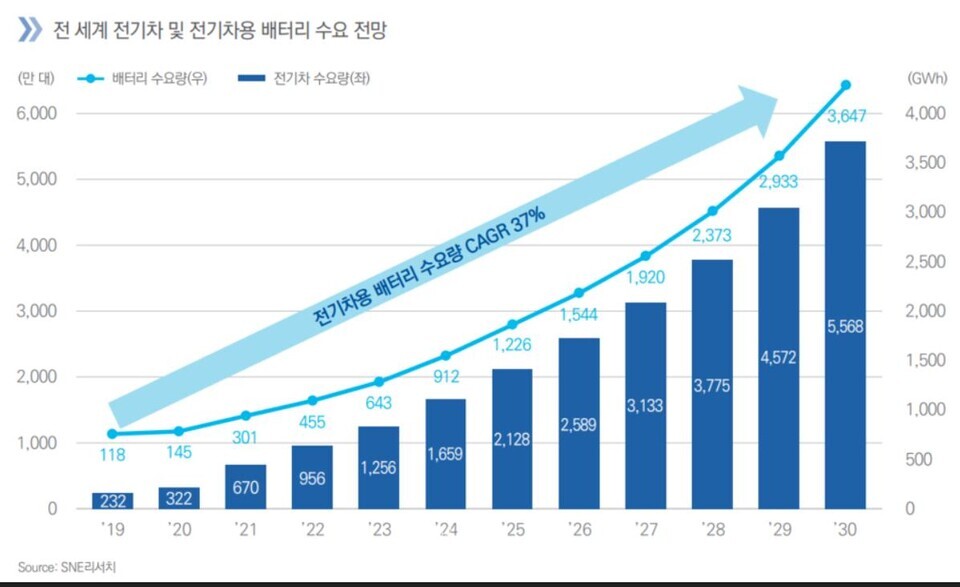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배터리 생산·사용 전 주기에 걸쳐 재활용 의무화 및 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배터리 제조 시 발생하는 ‘단재(offcut)’와 폐배터리에서 니켈·리튬·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추출해 다시 배터리로 활용하는 ‘자원순환형 생산체계’가 핵심이다.
정부는 2028~2030년 사이 재활용 금속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시장에 유통시킬 계획이다. 일본 내 배터리 생산 확대와 함께 단재 발생량도 증가해 2025년에는 연간 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제련 인프라 구축 본격화…수입 확대도 병행
현재 일본에는 희소금속 제련 인프라가 없으나, 2026년부터 스미토모금속광산(Sumitomo Metal Mining) 및 JX Advanced Metals 자회사가 제련시설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최대 250억엔을 지원한다.
또한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근거로 단재 및 폐배터리 재활용을 배터리 제조업체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본 내 발생하는 단재만으로는 원재료 수요 충당이 어려운 만큼, 미국·유럽으로부터의 수입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 EU 배터리 규제 대응 위한 ‘Battery Passport’ 플랫폼 구축
경제산업성은 2031년부터 시행될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별 성능 및 이력 정보를 가시화하는 ‘배터리 패스포트(Battery Passport)’ 시스템도 정비 중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중고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활용률 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EU는 EV 배터리 내 재활용 금속 비율로 △코발트 16% △니켈·리튬 6%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미이행 시 유럽 내 판매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관련 정보를 정부가 인증하는 데이터 공유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며, 전력 부문 스마트미터 정보와 연계한 탄소추적 인프라도 병행된다.
- 中 희토류 수출 규제, 글로벌 가격 급등…‘新 자원패권’ 신호탄
- IEA "에너지안보는 이제 전기망·AI·기후위기까지 포함하는 개념"
- [에너지 인사이트] 전고체 배터리 '풀라인업' 구축, K-배터리 미래 달렸다
-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총 1조 8240억원 투입
- [에너지 인사이트] 'EPR 제도 도입'은 배터리 생태계 해결 발걸음
- 환경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2027년 배터리 여권제 대응 본격화
- 환경부,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가 토론회’...LFP 재활용 및 인증제 논의
- 포항 폐배터리공장 또 황산누출 사고 올해만 3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