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불교의 대표적 가르침인 ‘제행무상(諸行無常)은 정치와 정책에도 적용된다. 특히 ‘탈(脫)원전’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 흐름은 이 격언을 절묘하게 입증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국정과제로 천명하며 핵심 전략 중 하나로 ‘탈원전’을 선택했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은 이런 방향성을 뒷받침했다.
정책 추진은 강력했고, 비판도 거셌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경제성·기술경쟁력 측면에서 원전의 가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 윤석열 정부는 ‘원전 부활’을 선언하며 정반대 길을 걸었다.
‘탈원전 정책 백지화’는 대선 공약 1호였고 실제로 집권 이후 건설 중단 위기의 신한울 3·4호기는 재개됐다. 원전 수출 역시 정책 우선순위에 올랐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부상으로 전력 수요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는 폭증하고 있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의 경고등이 켜졌다. 참으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전력 수요 급증은 다시 ‘기저 전원’ 확보의 필요성을 떠올리게 한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한계가 있다. 결국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 등의 원자력이 다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런 상황이 원전 정책 전환을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조차 ‘정책 유턴’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차기 대선의 명실상부한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경선 중 전력 안정성에 대한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脫 탈원전 기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즉, ‘탈원전’을 추진했던 진영에서조차 이제는 원전을 다시 껴안는 선택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정책은 시대 요구와 기술의 변화 앞에서 영원할 수 없다는 진실을 방증한다. 이는 마치 과거 잘못 알려진 한 에피소드를 연상케 한다. 19세기 말 영미에선 “발명될 수 있는 건 모두 발명됐다”는 말이 전설처럼 떠돌았었다.
흔히 미국 특허청장이 발언했다고 오해된 이 말은 사실 영국 한 잡지에 실린 농담에 가까운 풍자였지만, 당시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기술도, 정책도, 정치도 결국 ‘제행무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늘 아이러니를 동반한다. ‘탈원전의 역설’은 지금 이 순간 한국 에너지 정책이 맞닥뜨린 현실적 딜레마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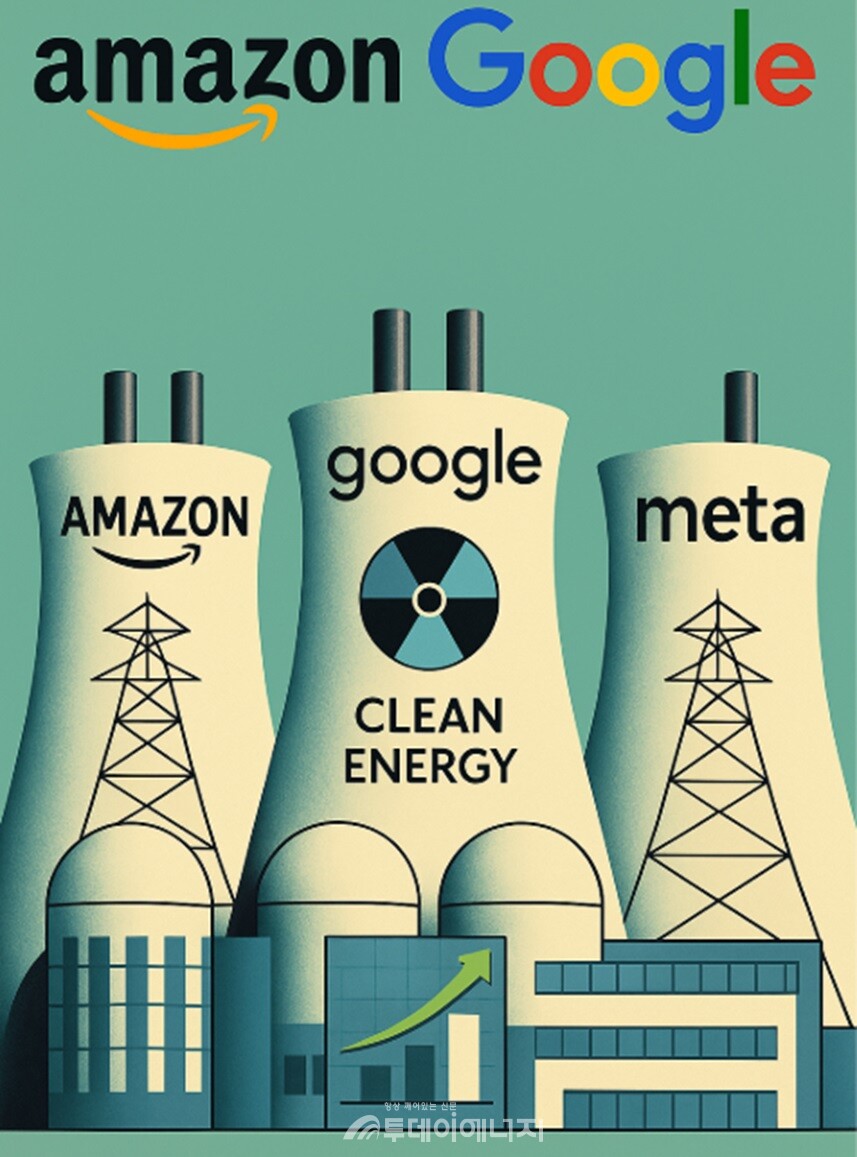
- 이재명,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 [이슈]이재명, 천연가스·LNG 정책으로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 이재명, 尹정부 ‘친원전’ 정책 계승하나...사실상 ‘탈원전 폐기’ 수순
- [기자수첩] 격랑의 원자력, 멈춰버린 시계
- [전망] 이재명표 원자력, '실용주의'로 간다
- [분석] “탈원전은 옛말”...민주당, 사실상 '脫탈원전' 흐름
- [분석] 탄핵이 뒤흔든 ‘원전 르네상스’
- [사설] 원전 방향성 신중해야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재생에너지 전환, 지속 가능한 미래 핵심 과제”
- 이재명, “분산에너지 편익 제공·인센티브 강화”
- [대선후보 에너지 정책] 과도기 LNG 활용 VS 원전 회귀 전략
- [분석] 기후 위기 앞 엇갈린 현실 인식...이재명 vs 김문수 ‘에너지 공약’ 격돌
- [포커스] “차기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 대비해야”...대형 로펌, 기업 대응전략 제시

